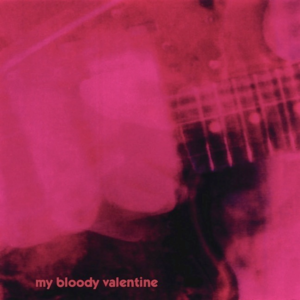10:00 ~ 13:00
- 오전 절반은 타운홀 미팅을 진행했다. 프로젝트가 시작되니 초기 세팅 방법부터 코드 리뷰까지 알려주었다. 팀 당 v100 서버 1개를 할당받는데 아직(9/10 14:33) 서버가 열리지 않았다. 서버 연결을 위해 VPN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서버와 어떤 원리로 연결되는지 궁금하다.
- 이후 절반은 프로젝트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 이제까지 단순히 개념학습을 위한 팀 활동과는 다르다고 생각했다. 나는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컨벤션이나 문서 작성 방법을 알아보려고 한다. 각자 부스트캠프 진도 나가기, 베이스라인 코드 돌려보기 등 다른 목표를 잡았다. 내가 부스트캠프에 참여하는 목적은 협업 경험을 추가하기 위함으로 협업 경험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겠다.
13:00 ~ 16:00
-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과 코드 컨벤션에 대해서 조사했다. PEP 8 규칙을 보는데 의외로 빡빡하다는 생각을 했다. 특히 복잡한 연산에서 그동안 코드를 잘 못 작성하고 있구나를 느꼈다. 예를 들어
a * b - c * d와 같이 작성했는데, 이는a*b - c*d로 우선 순위가 높은 연산을 묶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16:00 ~ 19:00
- 피어세션을 하면서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다름을 느꼈다. 나는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혹은 그 상위 개념으로 부스트캠프에 참여하는 목적이 명확해져야 갈 방향이 정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팀원들은 바로 다음 단계 할일을 정하며 진행하고 있었다. 그전까지 답답했던 점이 무엇이 서로 안 맞고 있는지조차 파악이 안 됐는데, 오늘 피어세션을 계기로 그걸 확인할 수 있었다. 피어세션이 끝나고 나서는 팀원들에게 아쉬움을 느꼈는데, 생각해보니 전혀 느낄 이유가 없었다. 그들은 그들의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 이런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 어떻게 말하고 들어야 하는지 생각해봤다. 우선 생각나는 역할은 제안자의 역할이다. 프로젝트를 위에서 바라보는 만큼, 나는 불편러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나와 다른 팀원들의 성향이 다르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다. 감정을 내세우는 불편러는 팀워크를 해치지만, 의문점을 던지는 불편러는 팀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불편러, 제안자로서 새로운 의견이나, 다른 관점에 대한 의견을 물어볼 예정이다. 내가 줄곧 자소서와 포트폴리오에 써왔던 문제를 재정의하는 방식 중의 하나인 셈이다.
그 다음 생각나는 역할은 중재자의 역할이다. 나와 다른 팀원들의 성향이 다르니, 다른 팀원들끼리 갈등이 생기거나 의견 차이가 있다면, 사이에서 조율을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감정적인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희망하지만, 만약 감정적인 갈등이 생긴다면 그걸 중재하는 것도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밴드 동아리에서도, 4.5층에서도 감정 중재자 역할을 많이 맡았고, 나 역시 갈등 당사자였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