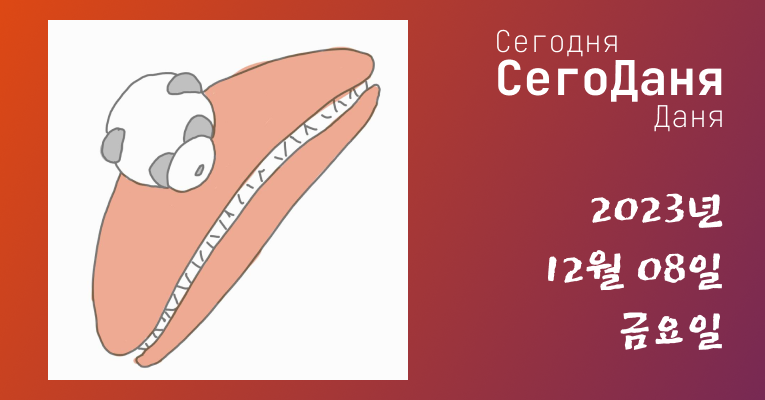휴식
오늘은 초연작이 없어서 그렇게 일찍 가지는 않아도 된다. 공식 콜타임은 17시, 하지만 보통 그 전에 가서 각자의 연습을 하고 있겠지. 나는 점심 때쯤 클라이밍을 하러 갈까 싶기도 했지만 오늘은 그냥 말았다. 오늘은 좀 사유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냥 갈 걸 그랬나 싶기도 하다. 오후까지 뭔가 몸이 안 풀린 느낌... 저번 공연 때도 늘 이런 상태로 공연을 올렸던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 하다 안해서 그런건지, 원래 이랬는데 새삼 느낀 건지... 내일은 주말이지만 오전엔 사람이 막 많진 않을테니 클라이밍을 하러 가볼까, 싶기도 하고. 어제 남은 기간 5일 뜨는 거 보고, 시간이 많이 흐르긴 했구나 싶었다.
연극 〈체홉 단편〉 ― 「적들」·「폴렌카」·「청혼」·「애수」
다섯 번째 공연. (「적들」 누적 5회, 「폴렌카」 누적 3회, 「청혼」 누적 2회, 「애수」 누적 2회)
선물?을 받았다.

다이소에서 파는 거라나 뭐라나. 역시 다들 판다만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뭐시깽이가 되어버린 것 같다. 조연출 님도 나한테 판다 좋아하냐고 하시더라. 그도 그럴 게, 판다 집게삔으로 머리를 집고 판다 후드 목도리를 두른 채 판다 그립톡이 달린 핸드폰을 들고 서 있었으니...ㅋ 판다 안 좋아하는데 그러고 다니면 그게 더 이상한 거임;;
아무튼 오늘의 공연은 그럭저럭 흘러갔다. 특별히 걸리는 부분도 없고 문제가 되는 부분도 딱히. 「적들」 공연 하고 「폴렌카」 동안 쉬다가, 인터미션 때랑 「청혼」과 「애수」 사이에는 장 전환을 했다. 특별히 문제가 되었던 건 없고, 다만 「청혼」 후 전환 때 테이블 집어넣는 분이 테이블을 깊숙히 넣지 않고 가서 공간이 애매했다는 점? 그래서 그거 집어넣고 내가 챙긴 것도 넣느라 시간 지연이 조금 있었다. 그래도 진행에 문제될 정도는 아니었지만, 공연이 끝난 후 이에 대해 언급은 해뒀다.
아 근데... 「청혼」 때 "사실이야"에서 반응한 시리 누구 폰이냐?? 어디서 들린 건지 파악을 못 해서 백스테이지에서 나랑 연주 선생님이랑 주변의 모든 전자기기 소리 줄이고 전원 끄고 다 처리(?)했다. 모니터링할 때 언급했으니 앞으로는 이런 이슈는 발생하지 않겠지.
여담
오늘은 계묘년 갑자월 경자일, 음력으로는 10월 26일. 오늘은 하루 종일 태블릿을 꺼내지 않았네. 좀 이따 썸네일 그릴 때에야 꺼내겠군.
시간을 돌려 중학생 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따위의 허상을 쫒지 않기로 했지만. 8년 전이었던가. 그 때까지만 해도 지나간 과거에 매몰되어 있거나 미래에 대한 망상에 빠져 현재를 보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그것에 대한 반발로서 현재의 성향이 나타난 거다. 다른 시간대에 밀려 현재를 놓치게 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이야기. 그리고 다른 시간대에 집착하지 않을 때에도 나는 나의 현실보다는 인터넷 너머의 공간에 살고 있었다. 그래서 말했다. 현재의 현실에 집중하라. 물론 그 말은 몇 년 동안 잘 지켜지지 않았고, 언제였더라. 하여간 그런 성향으로 돌아선지는 몇 년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온전히 나의 현실을 살고 있진 못했던 것 같다. 내 욕구를 쫒기 보다는 그저 흘러가는 대로의 삶. 내가 뭘 원하고 뭘 하고 싶은지, 그런 건 관심 없었다. 생각해보면 고립 시기 전체가 그런 식으로 흘러왔던 것 같다. 그러니까, 대충 고등학생 때부터 그래왔던 것이다. 입시부터가 전공 선택 이유를 "하고 싶은 게 없어서"라고 했으니. "언젠가 하고 싶은 게 생기면 여기서 익힌 문제 해결 능력과 여러 가지 방법론이 유용하게 쓰일 것 같다"는 합리성은 있었다. 내 생각을 나눌 친구도 딱히 없었고. 생각해보면 그래. 당시 학우들의 대화 주제 중에는 끼어들 만한 게 없었고, 그렇다고 그 대화를 위해서 그 주제에 대해 공부하고 싶진 않았다. 단지 대화를 위해 드라마를 보거나 아이돌 노래를 듣거나 애니메이션을 보는 건... 주객전도라는 느낌이다.
어쩌면 현재를 살아가되, 여전히 현실을 살지는 못하고 있던 것 아닐까. 그러다가 매주 사적인 시간을 함께 보내고,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고, 소소한 대화를 나누고, 그럴 수 있는 이들이 생기며 고립감이 줄어든 지금, 그 동안 보지 못하고 있던 무언가를 이제야 마주하게 되는 것 아닐까. 이제는, 인정할 건 인정하기로 했다. 고립청년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내가 느끼는 고립감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고, 그래서 공식적인 SNS 같은 데에는 관련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어떻게 보면 감추려 했던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이제는, 굳이 숨기진 않으려고 한다. 내 상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나아가야지.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것도 좋은 것 같다.
멀리 돌아 왔지만, 중학생 때로 시간을 돌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 정확히는 그런 이야기를 시작하려다가 말고 다른 이야기로 샜다. 때로는 의식의 흐름을 쫒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물론 때로는 이라고 하기에는 꽤나 자주 그러는 것 같지만. 문제의 핵심은, 내가 연극보다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최소 두 개는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업계 특성 상 연극이라는 것은, 그것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버티기 힘들다. 돈도 안되고 힘들기만 하고 그런 뭐시깽이... 그 속에서 다른 무언가에 정신 팔린 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중학생 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 나이 때부터 준비해보고 싶은 게 있다. 물론 그렇게 되면 내 삶의 많은 부분이 달라질 것이다. 현재 알고 지내는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에서 사라지겠지. 그 삶에서 남아있는 건... 수현이를 만난 후의 시점일테니 수현이에게서 비롯된 인간관계, 그러니까 @판다군부터 그 연장선은 남아 있을 수도 있겠네. 하지만 그 외의 인간관계는, 글쎄. 그런 삶에서는 내가 고등학생 때 그렇게 고립감에 빠지기 시작하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원사업에서 알게 되는 사람들은 불확실하고... 극단 사람들은 친분이 있을 가능성 자체가 사라진다.
그래도 뭐... 전공 지식을 직접적으로 활용하고 있진 않지만 분석-설계-구현-검증-배포의 사이클을 도는 소프트웨어공학부터 문서화의 영역까지, 전공 수업에서 배운 내용들은 다른 형태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으니 크게 후회되는 건 아니다. 그저 약간의 아쉬움? 그런 거 있잖아. 내 관심 분야의 무언가를 좀 더 일찍 시작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아쉬운 건 아쉬운 대로 지나간 일을 인정하고 현재로서의 최선의 선택으로 나아가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