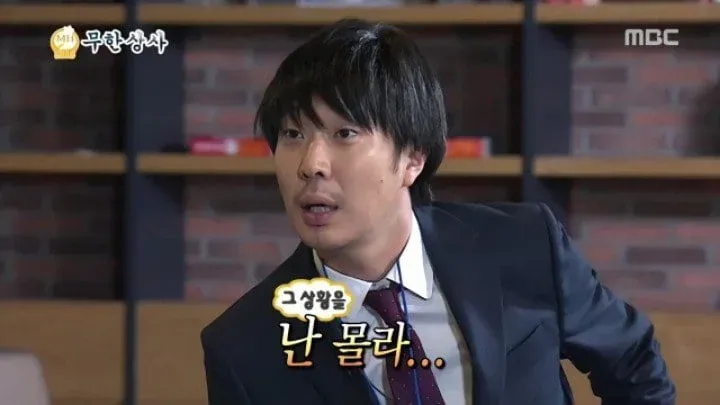
마지막으로 글을 올린 게 5월 8일이었는데, 그 동안 면접 준비하느라 미루다가 오늘에서야 드디어 100 번째 글을 쓰게 됐다. 어떤 주제로 글을 써야 할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는데, 면접 준비를 하면서 느낀 것들이 많아서 그것들을 주제로 쓰기로 했다. 물론 면접 꿀팁 같은 건 (아마) 아니다.
면접 준비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내 자신에 대해 알아보자'는 것이었다.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해볼 때 가장 크게 느낀 것은 내가 스스로에게 퍽 냉소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누구보다도 나는 내가 제일 잘 안다면서, 스스로를 절하하는 버릇이다.
사실 예전부터 알고 있던 것이긴 하다. 22년 여름 학기, 학교에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독서 세미나 수업을 들었던 적이 있는데, 이 수업에는 마지막 개인 에세이 과제가 있었다. 내 에세이의 주제는 다음과 같았다.
도저히 좋아할 만한 구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자신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가능할 수나 있을까?
이 에세이에서 나는 스스로를 '무엇이든 뱃속에 집어넣어 보지만, 삼키지 못하고 이내 토해내는' 사람이라 진단했다. 늘 가치있는 것이라 여길 만한 것들을 찾고,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들을 동경하면서도, 그게 막상 내 것이 됐을 때는 무가치하다며 경멸해버리고 만다는 것이다. 이런 병자에게 자기 사랑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내 결론은 내가 경멸하는 나를 사랑하는 법을 알아야 했던 것처럼, 나의 경멸로부터 사랑받는 법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과학의 철학적 이해"라는 교양 수업을 들은 적이 있다. 이 수업에는 ≪어린 왕자≫를 해석하는 파트가 있었는데, 그 중 어린 왕자와 장미가 싸우고 어린 왕자가 별을 떠나는 대목에서 어린 왕자와 장미가 싸운 것은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사랑받는 방법을 몰라서'라는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에 남았다. 사랑이라는 관계는 주는 이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받는 이도 있어야 하며, 이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 것은 대부분 '주지 못해서'가 아니라, '받을 줄 몰라서'라는 것이다.
자기 사랑도 마찬가지다.
고독한 자여, 너는 사랑하는 자의 길을 가고 있다. 너는 너 자신을 사랑하며, 그 때문에 너 자신을 경멸한다. 사랑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그같은 경멸을.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 '창조하는 자에 대하여' 中)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경멸이 있다고 말한다. 자신에 대한 경멸은 어쩌면 자기 사랑의 표지이고, 스스로를 경멸하는 사람은 이미 자신을 사랑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문제는 내가 자신으로부터의 사랑을 받는 데 익숙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다. 여전히 자기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혼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할 때는 늘 보완해야 할 점 밖에 보이지 않아서, 제대로 된 평가를 내리기가 힘들다 판단했다. '내가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아니지는 않을까?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나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물어봤고, 많은 도움들을 받았다.
그 중 하나는 열정에 대한 것이었다. '가장 열정적이었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보라'는 면접 단골 질문은 늘 답하기 어려웠다. 나는 스스로, '열심'히 하는 사람은 맞는데 '열정적'인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내가 '열정, 열정, 열정이 보이는 사람'이라면서, 이 질문에 답하기 어려워하는 게 더 의외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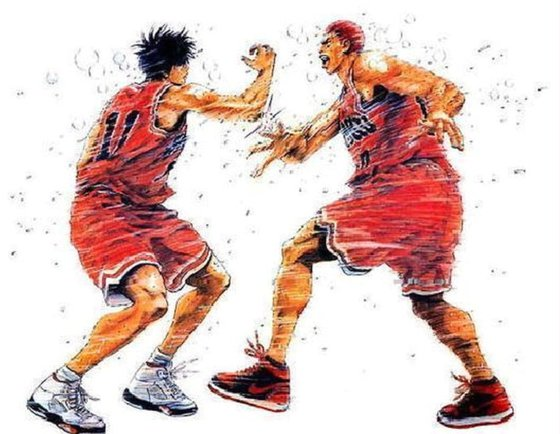 (사실 슬램덩크 안 봐서 잘 모름)
(사실 슬램덩크 안 봐서 잘 모름)
사실 열정이라고 하면, 이렇게 뭔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만을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기로는, 뜨겁지 않은 열정도 있을 수 있는 것 같다. 여전히 열정적인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보라는 질문에 답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는 없다고 말하지 않을 수는 있지 않을까...?
뜨거운 것만이 열정은 아니다.
또, 실패에 남는 게 실패 뿐인 것만은 아님을 알 수 있게 됐다. 시간이 지나면서 잊게 됐지만, 사실 이것도 예전에 친구가 이야기 해준 적이 있다. "지금까지 이것 저것 많이 해보기는 했는데 끝을 맺어본 건 거의 없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런데 친구는 사실 그런 것들을 해보려는 사람이 더욱 적다고 말했다.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다. 군대에서 아무 것도 모르면서, 불편하다는 이유 하나로 매크로를 공부하고 짜서 쓴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같다. 별로 필요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포켓볼 시뮬레이터도 마찬가지다. 굳이 이걸 좀 더 잘하고 싶다고 비슷하게라도 만들어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다. '실패 경험'에서 남는 건 실패만이 아니라, 경험도 있다는 걸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
여튼 주변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내가 내 생각보다 장점이 많은 사람임을 알게 됐다. 자기 확신이 부족하니, 주변 사람들을 믿어보도록 하자.
 (사실 그렌라간 안 봐서 잘 모름)
(사실 그렌라간 안 봐서 잘 모름)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뭘까? 내 삶을 이끄는 동력이 되는 건 뭘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흥미'와 '인정'이다. 뭐, 흥미야 더 말할 게 없다. '재밌으면 한 번 해보자'는 거니까. 그보다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인정'에 대한 것이다.
사람들에게 어떤 종류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걸까? 물론 여기에는 주변인이 가지고 있는 기대에 호응해 얻으려는 인정도 있다. 예를 들면 "일을 잘한다. 공부를 잘한다."라는 평가 같은 것들 말이다.
이러한 인정 욕구가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했다. 스터디원들과 식사를 하면서 '삶의 목적이 뭘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나는 내가 사는 데 뭔가 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한 게 없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이때 스터디원이 "그럼 그렇게 수능 공부 열심히 하고, 삼수까지 하면서 서울대 가려고 한 이유는 뭐야?"라고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내 답은 '내가 성장했다고 생각했는데도, 나보다 앞서 있는 친구들에 대한 열등감과 자존심'이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봤을 때, 이런 열등감과 자존심 같은 너절한 인정 욕구가 적어도 내 삶을 이끄는 주된 동력은 아님은 알게 됐다. 그보다 내가 더욱 받고 싶은 인정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였을 때, 다른 사람들도 좋아하는 것'에 가깝다. 말하자면 취향에 대한 인정 욕구라고도 할 수 있겠다. 예를 들면 내가 추천해준 노래를 주변 사람들이 좋게 들어주는 것, 내가 쓴 글, 내가 만든 프로그램, 내가 그린 그림을 주변인들이 재미있어 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전에도 몇 번 면접을 봤고, 또 면접 준비를 위해서 예상 질문들을 수십개 뽑아 나름의 답변들을 달아봤지만, 그땐 뭐랄까, 생각의 방향이 거꾸로였던 것 같다. 다시 말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얼 가치있게 여기는지를 생각하기에 앞서, 자신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질문들에 답을 내리는 데 급급했다. 이번 면접은 그보다, '자신에 대해 좀 더 깊이 이해해보자'는 생각으로 준비했다. 적어도 아쉬움 없는 면접을 볼 수 있었고, 그보다도 나에 대해 더 알 수 있어 더 뜻깊었다.
이제 100 번째 글도 썼으니, 그동안 미뤄놨던 공부 정리글들도 슬슬 올려야지.
3개의 댓글
Absolutely — Play Magical Casino https://ex.casino/casino/play-magical-casino is fully licensed by the UK Gambling Commission, which was a big reassurance for me. That license means strict regulations are followed, and I’ve personally felt very secure using the site. It’s one of the reasons I chose to sign up. Everything feels transparent, and it’s clearly a brand that takes player safety seriously.



잘한다 잘한다 짝짝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