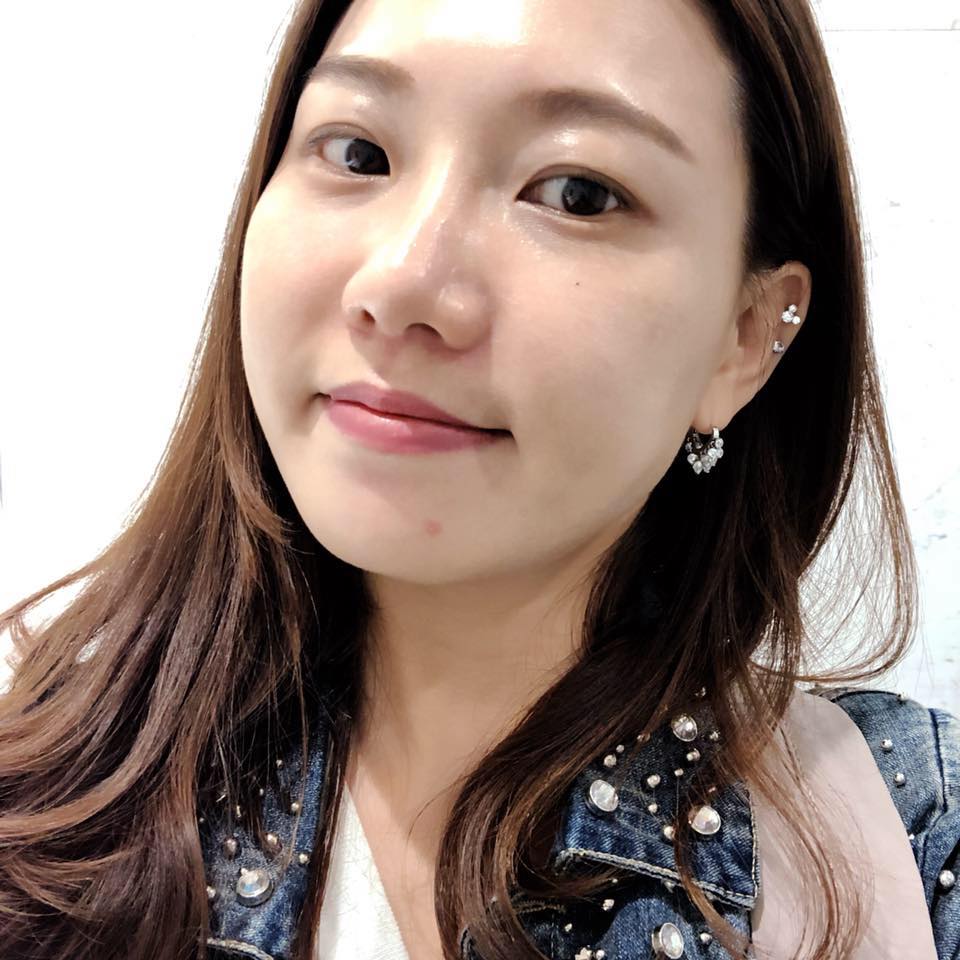👳♀️ 대화를 잘하는 방법
"네 문제는 이거야"가 아닌, "나에게 중요한 걸 표현하기"
니 문제는 이거야라고 얘기를 해나가는게 아니라
나에게 중요한 건 이거야를 표현 할수 있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모로서 내 아이의 안 좋은 점도 당연히 보이거든요.
🪧 안좋은 예시:
"넌 왜 이렇게 게을러 터져니?"
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말을 한다고 아이가 부지런해지지 않아요.
그럴땐,
내가 원하는 걸 말해보는 거예요.
🪧 좋은 예시:
아빠한테 중요한 건 같이 사는 거실이 깨끗해 지는거야
그러니 너가 먹은 건 치워줬으면 좋겠어"라고 말해보는 거예요.
👳♀️ 행복한 사람들의 말하는 습관
자신의 생각(인지)를 조절하는 전략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어려운 일을 경험해도
"괜찮아, 방법이 있을 거야"
라며 긍정적인 회로로 전환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어떤 사람들은 길 가다 넘어지면
"아이C 오늘 XX 재수 없네"라고도 얘길 하지만,
긍정적인 사람들은 길가다 넘어지면
"오늘 액땜했다"라며 말을 한다.
그들은 상실과 아픔을 긍정적으로 재처리하는 능력이 있다.
👳♀️ 불행한 사람들의 말하는 습관
그들은 해석의 왜곡성이 아주 높다.
예를 들어보면,
"오늘 만나서 반가워요"라고 인사를 하면
행복한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나에게 인사를 했네"라며 좋아한다.
하지만 불행한 사람들은,
"뭐지? 반갑지도 않으면서 왜 저러지?
뭘 시키려고 저러지?" 자기 일 잘하려고 저러나?
나보고 뭐 긴장 풀라는 거야?
라며 생각한다.
"밥 한번 먹자"라고 얘길하는데
너 빈말이잖아.
너 나한테 관심 없잖아. 너 뜨고 나서 변했잖아.
반응이 이런 식으로 돌아오면
상대방은 사실 만나기 쉽지 않아진다.
이렇게 상대방의 호의를 공격적으로 받는 이유는,
그분은 불신의 신념이 있는 거예요.
'해석의 왜곡성'이 생겨 감사하다는 말이 잘 안나오는 것
왜곡된 신념을 가질수록 대화는 어려워진다.
👳♀️ 인간의 모든 말은 둘 중 하나이다.
문화, 성별, 나이 등 상황이 달라도 인간의 모든 말은 둘 중 하나이다.
하나는 부탁의 말이고, 다른 하나는 감사의 말이다.
부탁이나 감사가 아닌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 왜곡해서 듣지 않는 소장님만의 방법
예를 들어,
자식: "아빠가 맨날 바빴지 나한테 해준게 뭐가 있어!" 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은 '부탁'이다.
천천히 손을 돌리면 아이의 말을 생각해 보면,
자식: "아빠, 나한테 시간 좀 내주세요. 아빠 내가 아빠랑 하고 싶은 게 많아요." 라고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식: 돈을 벌어서 어머니께 명품 가방을 사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 "으이구, 얼마나 번다고 벌써부터 이렇게 돈을 펑펑 써."
이렇게 말씀하시는건 감사이다.
어머니는 :
"너무 고맙다. 엄마가 이거 들고 다닐께"의 감사의 표현인 거예요.
가족끼리는 고맙다고 말을 하는것도 가끔 잘 못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가족끼리 고맙다는 말도 투박하게 하기도 하고 그런다.
그럴때는 돌려서 생각해 보면 된다.
최소한 가족끼리는 기분 나쁘게 말을 듣더라도 돌려서 생각해보자.
✍🏻 대화를 잘하는 아이로 키우는 방법
🚘 타당화(공감 능력)
아이가 힘들다라고 말을 할때에는 부모가 타당화를 잘해야 한다.
우리는 이걸 공감능력이라고 말을 한다.
아이가 느끼는 감정을 잘 받아주는 겁니다. (= 공감 능력)
이런 환경의 아이들은 커서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고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큰 자원이 된다.
거부할 때
싫다라고 말하는 자녀들을 대하는 건데,
딱 한번만 호기심을 가지고 그 싫은 이유를
아빠가 들을수 있게 한번 말해줄래라고 해보는 것이다.
자신의 욕구. 내가 뭘 원하고, 싫어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듣고 자란 아이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자신의 주장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 무례한 사람 대처 방법
야 꺼져! 너 생각이 있어, 없어?
이땐, 진짜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뚜껑이 열려서 자기도 모르게 나온 말이거든요.
비난하고 싶어서요.
이럴땐, 부하직원이라면 이렇게 말하면 좋다.
"'생각이 있어 없어'라고 하셨는데 잘 들은게 맞을까요?" 묻는 거예요.
그러면 상사는,
"그건 아니고. 왜 이렇게 일을 이렇게 했냐고" 라고 하면서 자기가 약간 하고 싶은 말로 돌아서요.
이렇게 들은 말을 그대로 그 사람에게 반복해서 말해주면,
말을 했던 사람이 그 말을 다시 듣고 자신이 실수했다는 걸 인지할 수 있어요.
출처 : 리플러스 연구소 박재연
https://www.youtube.com/watch?v=hz79jmkop5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