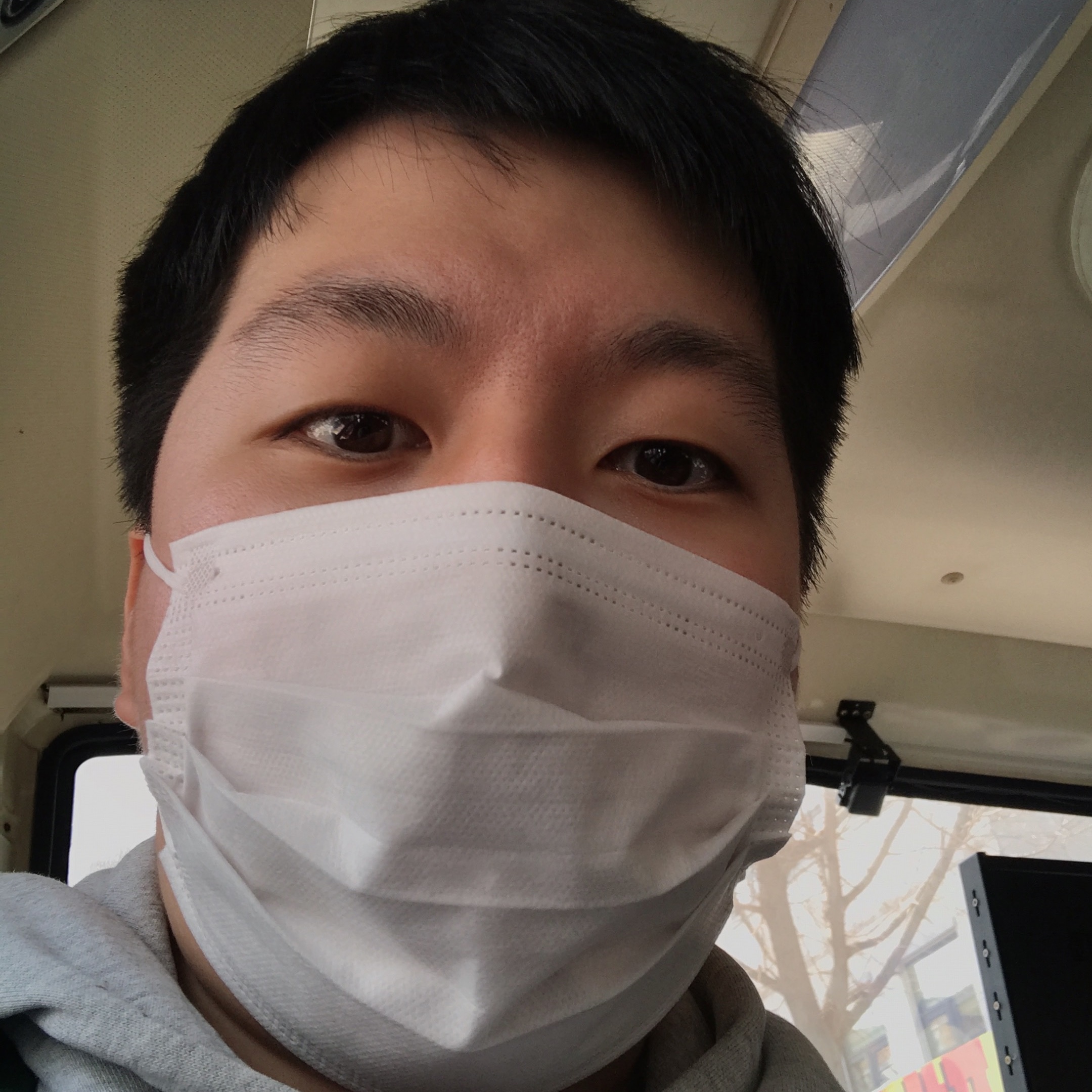과학적인(학술적인) 진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인풋 - 메소드 - 아웃풋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 뿐만 아니라, 기존에 잘못 알고 있던 것을 수정하는 것도 아웃풋이다.
종교적 진리 - 절대 불변의 진리
과학적 진리 -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perception = 지각
방법론
통계학 -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데이터 분석 방법과 기술 등을 공부하는 학문
조사방법론 -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 데이터 수집에 관한 방법과 기술 등을 공부하는 학문
과학방법론 - 과학(지식 형성) 대한 전반적인 담론적이고 철학적인 내용
Defenition of Statistic
Tools(indispensable tools) for transforming inputs into outputs in scientific studies.
indispensable tool = 없어서는 안 될 도구
Common to all sorts of sciences, including social and natural science.
Two wings(indispensible) for scientific studies
theory와 data
theory
- abstraction (어떠한 흐름을 관통하는 사실을 추출한다)
- paradigm(Meta-theory)/Meso-Theory/Micro-Theory(크기에 따라)
lateral(횡적인)
hierarchical(수직적인)
과학적이다, 과학적으로 유효하다는 뜻은 시공간적 제약이 있어야 한다.
spatio-temporal
data
- facts & findings, empirical(경험적)
노동 시장에 대한 예시
homogeneous (동일적, 균질적)
heterogeneous (이질적)
Spatio-temporal reference가 명확히 규정된 상태에서 argument가 주장되어야한다.
hypothesis
Instantiation of a theory
확률적인 hypothesis이 모여, theory를 이룬다.
통계적 결정오류(statistical decision errors)
귀무가설(영가설), H0(Null hypothesis)
대립가설(연구가설) H1(research or alternative hypothesis)
질문 1. 과학적인 연구라는 것은 결국 이론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공간적 제약 속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야 하지만, paradigm(Meta-theory)의 경우 실질적으로 옳고 그름을 한 번에 판단할 수 없으므로 수많은 Micro-theory를 통해 검증된다고 이해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paradigm이 최초 등장하는 시점에서는 해당 paradignm은 비과학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럼 최초 Paradigm을 제시한다는 것은 과학적이라기 보다는 통찰의 영역일까요?
질문 2. 종교적인 믿음은 과연 모두 비과학적인지 궁금합니다. 결국 종교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은 사실상 결국 인간이 시공간적으로 존재하는 범위 내에서 유의미하므로 시공간적 제약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래서 결국 아직 검증되지 않은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질문 3. 영가설과 대립(연구)가설의 구분에 대해서 어느 주장이 영가설이 되고 어느 가설이 대립가설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설명을 듣다보니 두 가지 가설 대립을 통해 결국 하나의 진리를 밝히는 것이라고 이해했는데요, 그럼 간단하게 생각하면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결국 하나인데 (O, X의 문제이므로) 현실적으로 측정 가능하고 작은 범위의 주장이 대립(연구) 가설이 되는 것이고 측정이 어렵고 현실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주장이 영 가설이 된다고 보면 될까요?
질문 4. 사후 가설화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를 못 한 것 같은데, 결과를 보고 이론을 만드는 것이 왜 비도덕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과학적인 연구는 어떠한 이론이 사실이 아닌지만 판단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사실상 모든 것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발견하여 제시하는 것을 쉽다고 하여, 비도덕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까요? 또한 모든 가설은 결국 인간의 관찰 및 경험, 통찰력 등을 바탕으로 만들어질 수 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결국 모든 연구는 다 사후가설화의 일종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