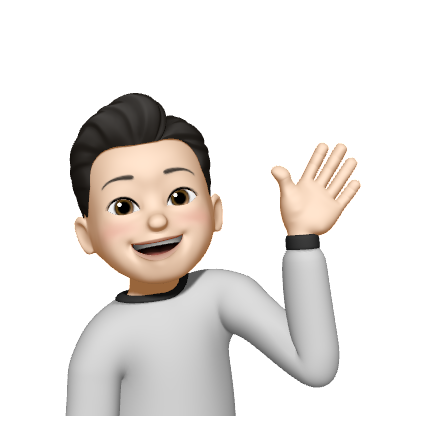iOS 취준에 대한 고찰
최근 원티드를 통해 여러곳의 기업에 이력서를 넣고 광탈하며 배운점을 써보고자 한다.
우선 내 전공이자 대학의 전부였던 기계과로 취준을 했을 때를 생각해보자.
나는 로봇이 좋았다. 대학교 1학년 때 보스턴 다이나믹스 로봇을 보고 완전 반해버렸다.
남들과 똑같은 클론이 되기 싫은 마음에 전역 후 일본과 미국 중 일본으로 가게 되었고(아 물론 로봇 산업을 경험하려고 한 목적도 있다)
그렇게 전역 한 뒤에는 짧지만 임팩트 있었던 1년의 해외 체류 경험을 갖게 되었다.
여전히 로봇이 좋아 전자공학과의 로봇 랩실에도 문을 두드려 봤지만, 사용할 수 있는 툴이 없다는 이유로 문전박대 당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아두이노와 라즈베리파이를 사용해서 코딩과 회로지식을 혼자 공부했다.
복학 후 JLPT(일본어 능력 시험) 1급을 취득했지만, 이 마저도 '일본어를 준비하는 학생이 있다면 클론이다'라고 생각해서 360시간의 일본어 번역 과정을 수료했다.
그런 와중에도 기계 전공은 손에서 놓지 않았다(나중에는 이게 발목을 잡았지만, 그 당시에는 학생의 본분을 다했기에 후회는 없다)
기계 역학 / 전자 공학 / 프로그래밍 모두 공부하다 보니, 어느 순간 프로그래밍에 더 손이 가는 자신을 발견했다.
4학년이 되어 취업 전선에 뛰어들 때 쯤 보니 이게 웬걸? 4차 산업 시대엔 학과 간의 경계를 무너뜨린 융합 인재가 취업 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었다.
그렇게 취준을 하며 면접에서는 탈락한 적이 있어도 서류는 100% 합격률이 나왔고, 서탈을 하고 곡소리를 내는 주변 동기나 후배들을 보며 '왜 떨어지는지' 이해가 안갔다.
졸업하자마자 취업에 성공했기에, 서류탈락이라는 실패에 대한 항체가 생기지 않았다.
28살, 1년 간의 짧은 사회생활을 한 뒤 내 인생에는 직무 변경이라는 큰 변곡점이 생겼다.
마찬가지로 취준을 했을 때처럼 나도 모르게 완성되어 있었던 '필살기'를 만들고, 학과 기초 지식을 공부하면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시작했다.
필살기가 되어 줄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직무는 다르지만 같은 개발자인 친구들과 CS 지식을 공부하고 인터넷 강의를 통해 좀 더 깊숙한 부분까지 공부했다.
그렇게 퇴사를 하고 6개월 뒤, 처음으로 이*이 재팬에 이력서를 넣고 서류와 코테를 통과했다.
사실 전공(직무) 변경 뒤 첫 이력서를 제출한 거라 큰 기대는 안했지만, 덜컥 면접을 보게 됐다.
그렇다고 면접을 열심히 준비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결과는 탈락이었다.
하지만 괜찮았다. 첫 술에 배부르면 안 되니까. 28살 지금까지 실패 없는 삶을 살아왔고, 실패를 겪는 건 당연하다 생각했다.
실패와 친해져야 한다.
면접 때 받은 질문을 복기한 뒤, 이력서를 가다듬고 다시 도전했다.
결과는 모두 서탈. 참담한 기록이다. 실패와 친해져야 한다는 걸 본인 스스로 인지하고 있지만, 내 자신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모든 실패에는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원인 분석에 들어갔다. 서류 조차 통과되지 못하는 이력서의 문제점은 뭘까?
나는 어떤 개발자가 되고 싶은걸까? 내 이력서를 HR이나 현업자가 봤을 때 매력적일까?
대학을 다니며 그렇게 '클론이 싫다'고 생각해왔던 내가 지금은 클론이 된 게 아닐까? 어디서 차이점을 만들어야 할까?
경력도 없는 쌩 신입으로 어떤 점을 어필 해야할까?
최근에 현직자이자 대학 후배인 친구에게 이력서 피드백을 받으며 첨언으로 들은 말이 있다.
어떤 개발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말문이 막혔다. 난 그냥 남들만큼 벌고, 경력 쌓는만큼 돈 더 받는 개발자라고만 생각했다.
여기서 '나는 그냥 클론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 기계과를 전공 취준했던 시절로 돌아가보자.
나는 로봇에 대한 꾸준한 애정과 그 애정을 뒷받침하는 경험을 쌓아 왔다. 일본 생활을 시작으로 메카트로닉스 랩실에 들어가고, 랩실 동기들과 드론이나 탐사 로봇도 만들어서 대운동장에서 날려보고, 스마트 팩토리 교육도 들었다.
로봇 자체를 개발하는 게 좋아서. 그리고 그 로봇이 내일은 더 원하는대로 구동하는 모습을 보는 게 좋아서 몰두했다.
결국 그 끝은 현실적으로 석박사의 길에 막혀 제조업의 스마트 팩토리 관련 직무로 틀어졌지만 취업에는 성공했다.
즉, 로봇을 개발하며 '내일은 더 멋지게 작동하는 로봇을 개발'하는 게 좋았다.
헌데 지금까지 내 생각은 '그냥 남들만큼 버는 iOS 개발자'였다.
이런 생각으로 이력서를 작성하니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CLONE 28호'에 불과했다.
자, 다시 나는 어떤 개발자가 되고 싶을까?
예를 들면 '기본에 충실한 개발자', '트렌드에 민감한 개발자', '사용자와 프로적트를 생각하는 개발자'가 있겠다.
"엥? 세개 다 충족해야 하는 거 아니여?"라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겠다. 물론 맞다. 세개 다 만족해야한다. 그래도 기둥 하나를 완벽하게 세워놔야 양쪽에 무얼 걸든 균형이 맞을 것이다.
기계로 취업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기계전공이라는 기둥 하나에 양 옆에는 '좌 전자' '우 SW' 덧붙여서 '외국어'까지 있었다.
이제는 개발자라는 이름을 가진 기둥을 밸런스있게 만들어야 한다.
얼마전 UIKit 프레임워크에 RxSwift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프로젝트를 완성했다.
완성한 뒤, SwiftUI 퍼스트파티 프레임워크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 점에서 미뤄보면 나는 트렌디한 개발자로 기둥을 세우는 게 맞을 것 같다.
고민 없는 성장은 없다.
이전의 마인드를 반면교사로 삼고 전진하자..
이제는 트렌디한 개발자로 기둥을 세워 밸런스 있게 꾸며 나가야겠다.
F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