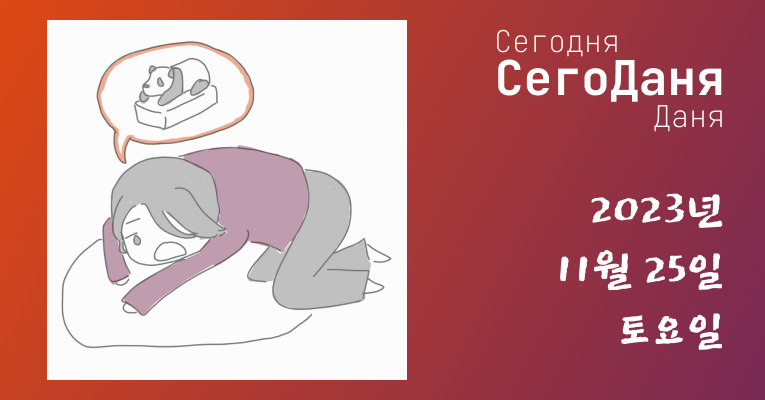활동 게시물 작성
더 이상 미루면 정말 계속 미루겠군, 싶어서 화요일에 진행한 태니지먼트 검사에 대한 게시물을 작성했다. 아무리 밀려도 일주일 안에는 처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 모든 게 다 흐지부지되는 경향이 있다. 이걸 보는 당신도 무언가 미루고 있다면 당장 이것을 닫고 그것부터 하고 오도록. 너무 잔소리 같다고 생각하진 않길 바란다. 독자에게 말 걸곤 하는 만화를 보다보면 이렇게 된다.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아무튼 그런 거다.
이런 검사 결과의 기록은 대체로 언젠가의 미래에 돌아보기 위함이다. 뭐시깽이 검사를 한 적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더라, 하는. 분명 난 그 결과를 기억하고 살진 않을테니 말이다. 그리고 검사에서 나온 결과를 돌아보며 무언가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 가끔은 그런 사유의 시간을 갖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장르문학 동아리
일주일 정도 안 건드리고 방치하고 있었다. 왜냐, 글쎄. 왜였을까? 사실 어제 좀 쓰려고 했는데 카페 모임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 뭔가 되게 빠지고 싶지 않은 자리였다(?). 애정과 관심을 담아 함께 하는 시간을 갖느라 뒤로 미뤄버렸다. 그리고 12일보다는 13일이 더 나을테니까, 라고 주장해본다. 하여간 오랜만에 소설을 써내려갔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첫 편을 너무 잘 써서(?) 그걸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다. 어느 날 오후 종로에서 스트레칭 하면서부터 구상하여 클라이밍을 하면서 시놉시스를 떠올린 이야기. 그건 진짜 금방 써졌고 또 잘 써진 이야기였다.
아무튼 너무 오랜만에 건드렸더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진행하려 했더라...? 일단 기본적인 시놉시스는 적어놓은 게 있는데, 구체화가 잘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지난 번 주제는 참 미묘하다. 클라이밍을 하는 그 시간 동안 시놉시스에 대한 구체화도 대충 끝나 있었다. 다만 그걸 다 쓰고 잘 시간적 여유가 되지 않아 시놉시스 정도만 적어놓고 초안 작성은 다음날로 미룬 것이었을 뿐.
오늘 작성한 분량은 그리 많지 않다. 활동을 재개한 것에 의의를 두며, 본격적인 작업은 다음주로 미룬다. 오늘은... 조금 끄적이다가 휴식. 오늘은 좀 쉬는 게 좋을 것 같다. 아까 밀린 게시물 작성할 때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오히려 요 며칠 중 생산성이 꽤나 괜찮은 편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지 못하다.
여담
오늘은 계묘년 계해월 정해일, 음력으로는 10월 13일. 만월이 다가올수록 생산성이 높아진다. 상현달 기간에는 동적인 이것저것을 하는 게 효과적이고 하현달 기간에는 정적인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게 효과적이다. 어떤 원리냐고 하면 딱히 할 말은 없다. 이건 그냥 관측 결과다. 달의 위상과 나의 상태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음을 인지했을 뿐이다. 어떻게 인지했냐고 한다면, 글쎄. 그저 달의 위상에 대해 파악할 일이 있는데, 이에 대한 기록 도중 문득 발견했다고 할까나. 다만... 오전까지는 괜찮았는데 오후가 되니 내일 아침 일찍부터 동아리원들 만날 생각 하니 넘무 두근두근하다. 두근두근하면 무언가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게 힘들어진다. 하여간 좀 그렇다.
최근에 느낀건데, 좀 편하게 터놓고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좀 생기니까 있는 그대로의 나를 드러내게 되는 것 같다. 내 흥미에 솔직하고, 내 욕구에 솔직하게. 이러다보면 상대의 좋은 점도 그렇지 못한 점도 아무렇지 않게 툭툭 던지기 때문에 가끔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한 언급에 상처 받는 이들도 생길 수 있...으니 그건 조심해야지;; 태니지먼트 검사에서 "당신은 팀원의 단점을 직설적으로 지적할 우려가 있습니다" 보고 팩폭 맞았잖아(...);;
솔직히 내가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슈가 뭔진 나도 알고 있다. 워낙 사람을 쉽게 기억 못 하다보니 몇 번을 만났던 사람조차 초면인 것처럼 대할 때가 있다. 혹은, 몇 번 보다보니 얼굴은 익숙한데 이름은 도저히 떠오르지 않는다거나. 그런데 이전 만남에 어느 정도 가깝고 친하게 지냈다면, 그 친밀도가 리셋된 것처럼 초면으로 취급하는 게 상대로 하여금 서운한 마음이 들게 하곤 한다. "같이 이러저러한 이야기도 하고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저 사람은 나를 기억 못 하네. 나는 그 정도 관계였나보다" 하고 서운해하며 떠나가는 이들이 여럿 있었다.
그렇기에 누군지 어느 정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거리를 두는 습관이 생겼다. 낯 가리는 척...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이름은 몰라도 얼굴은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거리를 줄여 나간다. 그 사람은 다음 만남에 알아볼 수 있을테니까. 얼굴이 익숙해지기 전의 기억은 나중에 그 사람과 충분히 가까워지더라도 그 사람과 그 사람이 동일인물이라는 걸 매치하기 힘들다. 난 정말 청년공간에서 노래방 기기 마이크를 번갈아 붙잡고 있던 사람의 존재는 기억하지만 그게 클라이밍 동아리 조장님과 동일인물이라는 건 나중에 들어서 알았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건 도저히 매치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또 이름도 얼굴도 인지 범위 밖으로 사라져버렸지만, 작년부터 나랑 아는 사이였다고 하고, 여름부터 가끔 마주치는데 만날 때마다 내가 기억 못 하는 분이 계신다. 아니 근데 다른 사람도 기억을 잘 못 하지만 그 사람은 유난히 잘 잊혀져(...).
사람마다 기억되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편차가 크긴 하다. 이렇게 늘 새롭게 대하는, 매일이 초면 같은 나에게도 한 번에 기억에 남은 사람도 가끔 드물게 존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름 들으면 "아 그 분이구나"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름 들어도 "누구...시더라" 한다. 작년부터 아는 사이였다는 그 분도 후자의 경우라 좀 미안해지더라. 똑같이 작년에 같은 공간에서 처음 만났을 김JH 님은 올해 처음 봤을 때 바로 그 분이라는 걸 알아봤는데 무슨 차이일까. 근데 김JH 님 같은 경우에는 인상이 튀고, 항상 같은 모자를 쓰고 다니시긴 해. 우리 보드게임 마스터 님 같은 경우에는 레크레이션 같은 거 종종 진행하시곤 하니까 자주 뵀을텐데 인지하는 데까진 몇 주 걸린 것 같고, 이름을 인식한 건 또 최근 일이란 말이지... 근데 여름부터 꾸준히 뵙곤 했던 조HS 선생님도 지난 수요일 글램핑에서 이름을 처음 인식했ㅇ...
하여간 그래도 그런 기억 이슈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이해해주시고 내가 누군가를 잘 기억 못 하더라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주시는 분들이 있어 좀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던 것 같다. 전에 함께 한 적 있는 사람에 대해 내가 기억 못 하고 있을 때 옆에서 "저 분은 무슨무슨 프로그램 때 오셔서 이러저러하셨던 분이다" 같은 식으로 내가 그 사람을 떠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도 가끔 계시고. 늘 감사하다. 언제까지나 내 친구 비스꾸레한 관계로 남아주셨으면...ㅎ
내일은 일찍 일어나야 하니까 일찍 자야지. 생각해보니까 맨날 캔버스화 신고 다녀서 오래 걷거나 뛸 때 신을 만한 신발이 없더라. 이거 말고는 부츠라던가... 하여간 적당한 게 없더라. 그걸 이제서야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무계획의 극치를 볼 수 있다. 그래도 당일에 신발 신으려다가 인식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가족의 물건 중 그나마 쓸 만한 것을 훔쳐 빌려 가기로 했다. 물론 당사자와 합의된 사항은 아니다. 적당히 두꺼운 양말 신고 신으면 240 사이즈도 잘 신을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