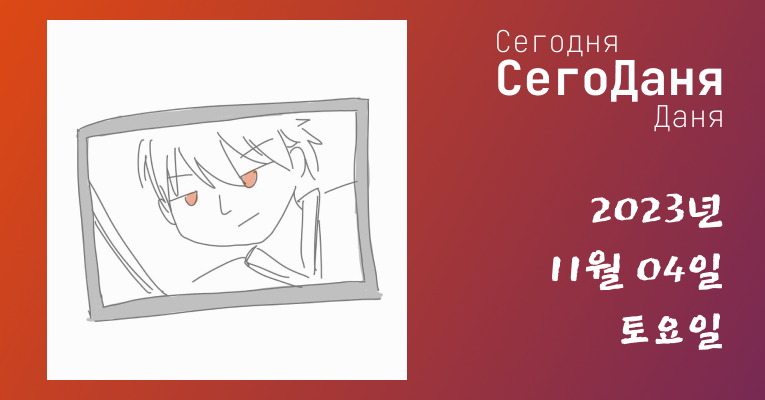
Watcha
지난 번에 보던 애니메이션의 최종장 12편을 보기로 했다. 한 편에 약 25분이니까 대략 5시간. 오프닝 엔딩 곡 제외하면 그것보다는 덜 나올 것이다. 먹을 것 챙겨서 9시에 만나 왓챠파티로 보기로 했는데, 파티원이 9시에 먹을 것을 챙겨오겠다고 하더라(...).
연습실
오늘은 화술 훈련을 했다. 지난 번에 했던 대본 그대로. 분명 새로운 대본을 보내준다고 했는데 받지 못 했다. 뭘까. 요즘 학회 측과 논의할 것도 많고 해서 바쁘고 정신 없으시긴 할 것 같다. 사실 기존 대본으로도 완벽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렴 어때, 하면서 진행하고는 있다.
Watcha
오전에 본편을 다 보고 연습실 다녀온 후 극장판을 봤다. 확실히... 많이 생략된 느낌이 들긴 한다. 원작... 원작 만화책이 필요하다. 어찌 되었건... 10여 년 전부터 틈틈이 함께 해오던 작품의 끝에 도달했다. 남들보다는 조금 늦게 도달한 거겠지만 아무렴 어때. 10년이 조금 넘는 시간을 함께 해온 녀석들이다. 그 시간 속에서 스쳐 지나간 다른 작품들에 비해 유독 곁에 존재하는.
이 작품뿐만 아니라 몇몇 작품들이 그러하다. 그저 "봤다"를 넘어서 삶에 녹아든 듯한 이야기들. 마지막으로 본 지는 정말 오래되었지만, 바로 오늘 본 것처럼 안고 사는 작품들. "우리는 긴상의 xx를 쫒아 살아온 녀석들이잖아" 같은 소리를 할 법한 뭐시깽이. 『20세기 소년』도 그렇고, 그런 작품들이 몇 있다. "봤다"의 영역뿐만 아니라 "들었다"의 영역에도 그런 존재가 있고. 10년 전에 듣던 음악이라던가. 그래, 그러고보면 그 대부분의 것들은 10여 년 전으로부터 비롯되었다. 2011년부터 2013년 사이에 시작된 것들. 그 시기가 나에게 어떤 의미로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라 형용하기 어려운 "무언가"로 남았다.
그 시간은 잊을 수 없는 이름들도 남겼다. "수현"이라던가 "승태"라던가 "유진"이라던가 하는 이름들. 어쩌면 그 10여 년 전의 시기는 "나"로서의 내 삶의 시작점일지도 모르겠다. 10대 초반까지의 이야기들은 기억과 함께 잊혀지고, 난 10대 중반부터를 살아왔다. 정말... 별 거 아닌 개그만화 같으면서도 잡다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녀석이라니까.
독서
여전히 『철학자의 걷기 수업』을 읽고 있다. 아직 반도 안 읽었기에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 책을 읽겠지. 그리고 이 책을 다 읽을 때쯤 되면 11월의 리뷰 도서가 도착하지 않을까. 11월의 리뷰 도서도 어느 책을 고를지 고민되긴 하더라. 흥미로워보이는 게 몇 권 있어서 말이지... 하여간 그건 메일이 오길 기다려보자고.
내면의 균형은 정지 상태라기 보다는 오히려 역동적 생동감으로 가득찬 상태다. 단조로운 걸음의 반복 속에 얻는 고요한 균형과도 같다. 이건 참 흥미로운 이야기다.
장르문학 동아리
오늘은 이것저것 하다보니 많이 쓰지는 못 했고, 두 문단 정도 작성했다. 이 이후의 내용은 목요일에 시놉시스 쓰려다가 초안을 써버린 느낌이라 조금만 매끄럽게 정리하면 초안은 대충 끝날 것 같다. 그러고 나면 또 전체적으로 한 바퀴 돌며 다듬을 거 다듬어야지. 내일은 별다른 일정 없이 널널하니까 초안을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여담
오늘은 계묘년 임술월 병인일, 음력으로는 9월 21일이다. 적당히 늦게 일어나서 적당히 애니메이션을 보다가 적당히 연습실에 다녀와서 적당히 애니메이션을 마저 보고 적당히 책을 읽다가 약간의 글을 쓰는 하루였다. 대체로 휴식에 가까운 무언가였던 듯. 꽤나 가볍?게 흘러간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