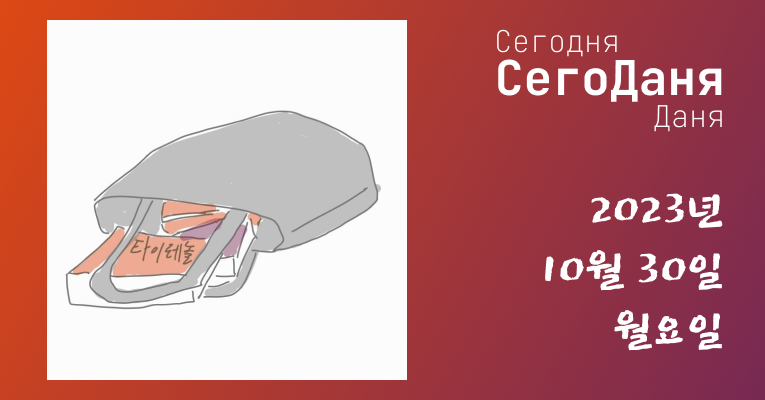
아침 공부
가볍게 300xp 정도 공부했다. 많이는 아니고, 그냥 딱 그 정도. 여기에 시간을 너무 많이 쏟기 보다는 그냥 그렇게 가벼운 정도로 유지해야지.
한 주를 시작하는 정리
청소기를 돌렸는데 먼지를 잘 빨아들이지 못 하는 것 같다. 뭐가 문제지... 청소기를 최소 몇 주만에 쓰는데 그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가족이 거실 청소기 돌릴 때 보면 이렇게까지 못 빨아들이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하여간 대충 쓸고 넘어간다. 적당히 큼직한 것들만 처리하고 재활용품 쌓아둔 것들을 처분했다.
아직 좀 덜 자리잡힌 것들이 있긴 한데... 이건 차차 적절한 공간을 찾아보도록 하자.
건강지킴이
그런 지원사업 프로그램이 있길래 신청해봤다. 공복혈당과 혈압을 체크해보고 건강 상 고려해야 할 것이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진 후, 점심 식사를 하고 해산했다. 진통제, 소화제 등의 상비약과 작은 비상의료키트를 선물로 받았다. 나의 공복혈당은 87mg/dl이고 혈압은 최고 127mmHg에 최저 83mmHg, 그리고 분당 심박수 77회로 딱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한다. 대충 건강하긴 한 것 같다.
클라이밍파크 종로점
시간이 애매해서 그냥 출발해버렸더니 평소보다 한 시간 정도 일찍 가게 되었다. 네 번째 난이도 문제 중 풀었던 것을 다시 풀어보는데 이미 해봤던 거라서 그런지 계속 하면서 역량이 강화되어서 그런지 처음 성공했을 때보다 수월하게 진행되는 것 같다. 성공해본 적 없는 네 번째 난이도 문제도 두어 개 완주하였고, 아직 중간에서 포기하곤 하여 이후 다시 시도해보고자 하는 것도 두세 개 있다.

늘 그렇듯 현재 난이도보다 한 단계 높은 것을 슬쩍 찍먹 해보곤 하는데, 다섯 번째 난이도는 좀 어나더 레벨이더라. 스타팅에서 한 홀드도 더 이동하지 못한 채 포기하거나, 심지어 스타트 홀드를 잡은 채 발을 매트에서 떼지도 못한 경우도 있다. 첫 날 세 번째 난이도를 찍먹 해보면서도 스타팅에서 한 홀드도 더 이동하지 못했지만, 다섯 번째 난이도는 그것과 별개의 어나더 레벨인 것 같다. 그 아래 난이도들은 역량이 안 되어 못 올라갈 때도 어떻게 갈 수 있는지 대충은 보였는데, 다섯 번째 난이도부터는 그게 안 보이는 것들도 종종 있다.
그래도 이제는 "이 정도까지는 미끄러지지 않는구나", "이 정도까지는 버텨지는구나" 하는 것들이 좀 파악이 되는 것 같다. 여전히 자신이 없어서 역량을 다 발휘하지 못하는 영역이 좀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봤을 때 아직 못 푸는 네 번째 난이도 문제들은 대체로 자신이 없어서다. 아래서 봤을 땐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 겁 먹어서 주저하는 뭐시깽이...ㅎ 가끔 세 번째 난이도 문제도 그렇게 겁을 먹곤 하는데 스스로에게 "아니. 이거 분명 할 수 있잖아" 하며 강행하면 어떻게든 끝에 도달해있긴 하더라(...).
저녁 공부
저녁엔 400xp 정도 한 것 같다. 특별히 이렇다 할 뭐시깽이는 없는 듯. 눈에 띄게 늘지는 않는다. 무슨 단어를 익혔는지도 모르겠다. 근데 틀리는 양은 또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냥저냥하게 흘러가는 것 같다.
독서
어제 읽던 책, 『철학자의 걷기 수업』을 이어서 읽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방랑자의 삶. 때로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어쩌면 나의 삶은 그런 방랑자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뚜렷한 목표가 있지도 않고 미래를 상상해보지도 않는, 그저 현재를 살아가는 삶. 어느 지점을 향해 나아가기 보다는, 그저 현재를 걷다보면 지나온 삶의 영역에 나의 길이 그려지며, 앞으로 나아갈 길은 아무도 알 지 못하는 막연한 미래로 남겨 두는 것. 삶이란 언젠가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현재의 연속이다. 그렇기에 현재의 현실에 집중하다보면, 언젠가 돌아봤을 때 그 삶은 유의미한 무언가로 존재하지 않을까.
여담
오늘은 계묘년 임술월 신유일, 음력으로는 9월 16일이다. 요즘 어디서 내 번호로 무언가를 했는지 무슨 주식 투자니 뭐니 하는 것부터 모르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연락까지 스팸성 연락이 종종 오고 있다. 어디서 비롯된 이슈인지는 모르겠다.
누군가는 자신이 좋아하는 작가의 책을 찾아본다. 누군가는 자신이 좋아하는 장르의 책을 찾아본다. 나는 주로 작가나 장르보다는 출판사를 기준으로 책을 보는 것 같다. 이러이러한 책은 한빛미디어가 좋다, 이러이러한 책은 유유 출판사가 좋다 등등. 구체적인 장르에 대한 개념은 잘 모르지만 그 어떤 두루뭉실한 느낌으로 선호하는 출판사들이 몇 있다. 그리고 그 출판사의 책이라는 이유만으로 마주한 책이 제목이 끌리고 표지가 끌리고 목차가 흥미롭다면 읽어보는 것이다. 결국엔 제목과 표지와 목차가 그 책을 읽을 것인지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지만, 모든 책을 다 살펴볼 수 없기에... 그 1차적인 필터로 작용하는 게 출판사인 것 같다.
결국 그 출판사의 책을 기획한 출판 기획자―주로 편집자―의 안목을 믿는 것 같다. 그럼으로써 한 작가, 혹은 특정 분야의 책만을 쫒는 것보다 다양한 범주의 책을 만나볼 수 있는 것 아닐까. 내가 신뢰하는 그 어느 출판사의 필터링을 거쳐서 말이다.
